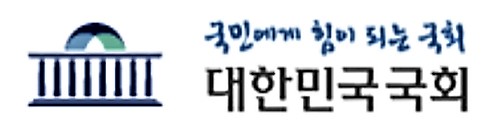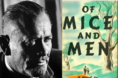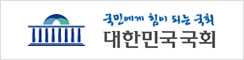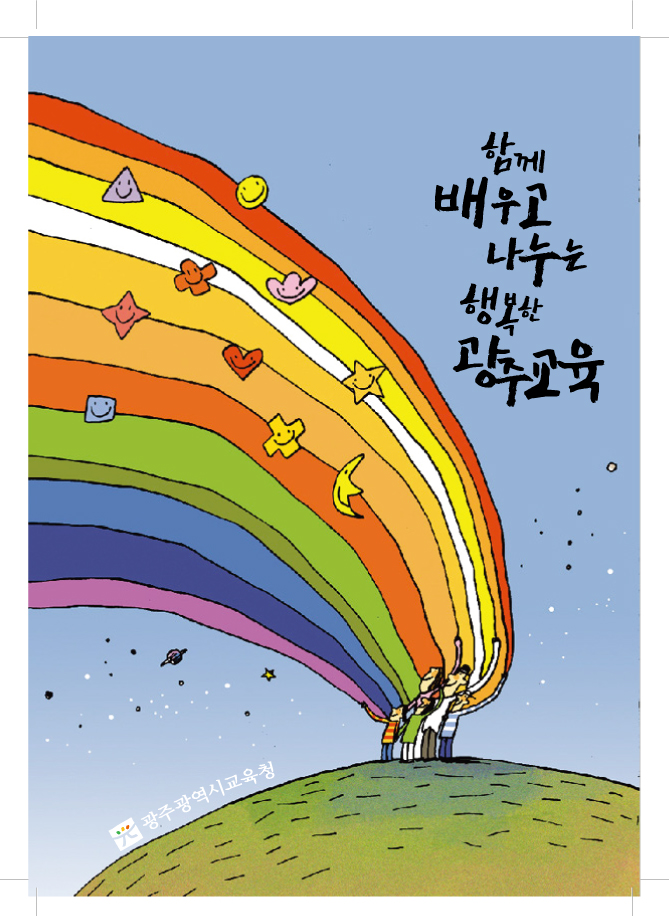한 해가 저물 무렵이면 우리는 습관처럼 ‘송년회’나 ‘망년회’를 떠올린다. 오래 써 온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어딘가 메마르다. 최근 사단법인 한글문인협회가 연말 행사의 이름을 '마무리'라 부른 장면은, 연말을 대하는 우리의 언어와 감수성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말 하나가 시대의 정서와 문화의 온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는 순간이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한 해가 저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송년회'나 '망년회'라는 말을 떠올린다. 오랫동안 써 온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어딘가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자어 특유의 딱딱함 때문일까. 연말이라는 시간의 온기와 여운을 전하기에는 감정의 결이 다소 멀게 느껴진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한글문인협회(이사장 정명숙)가 올해 행사의 이름을 '2025년 마무리 행사'라 붙인 점은 눈길을 끈다. 한자어 대신 한글로 삶의 시간을 부르는 이 선택이 새삼 반갑다. 세종대왕도 미소 지으실 법한 우리말이다. 언어는 시대의 감수성을 담아야 하기에, 우리말의 멋과 온기를 살린 표현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의미 깊다.
'송년회'는 '보낼 송(送)' 자에 '해 년(年)' 자를 쓴 말이고, '망년회'는 '잊을 망(忘)' 자를 쓴다. 한 해의 고단함을 흘려보내고 잊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으니 의미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단어 모두 한자 표기에 기대고 있어, 우리말 특유의 정서와 체온을 담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감정의 숨결은 옅다. 때로는 '껍데기만 남은 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 더 다정한 표현을 찾는다. '연말 나눔', '올해 마지막 자리', '따뜻한 마침 모임'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입에 오른다.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는 단순히 모임을 지칭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선언이다. 말 한 줄이 달라지면 모임의 분위기와 기억의 결까지 달라진다.
새말을 만든다고 해서 옛말을 버리자는 뜻은 아니다. 언어는 세대나 가치의 대립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레 확장되는 그릇이다. 한 해의 끝은 지난 시간을 비추어 보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 특별한 시간을 '송년회'라는 세 글자로만 담아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말에는 정서적이고 온기 있는 표현을 빚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2025년 마무리 시간'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낯섦이 우리말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한다. 한자어에 기대지 않고 우리말로 의미와 감정을 담아내려는 시도는 언어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과정이다. 새말을 만드는 일은 시대의 언어를 스스로 빚어 쓰는 '문화적 선택'이며, 표현의 영역을 넓히는 일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며 강조한 정신은 '사람마다 쉽게 쓰게 하라'는 데 있었다. 이는 단지 글자를 배우기 쉽다는 뜻을 넘어, 삶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연말을 부르는 말 또한 우리의 감정과 풍경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달라질 필요가 있다. '해넘이 자리', '한 해 갈무리', '따뜻한 마침 자리', '해 끝 어울림' 같은 표현에는 우리말 특유의 부드러움과 여백이 살아 있다.
언어는 늘 시대와 함께 변해 왔다. ‘연말’이라는 말조차 지금처럼 일상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새해맞이', '연말정산' 같은 표현들 역시 현대의 삶의 구조와 함께 만들어진 말들이다. 말이 생기고 사라지는 과정은 곧 우리의 생활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한 문화에는 그에 어울리는 언어가 필요하다.
요즘 세대는 언어의 감각을 더욱 섬세하게 다듬는다. '잔잔한 하루', '여유 챙기기', '마음 정리의 시간' 같은 표현들이 널리 쓰이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개인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려는 욕구이며, 한글의 정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연말의 이름 또한 시대의 감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말에는 이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다. '갈무리'가 그렇다. 본래는 수확물을 정리해 저장한다는 뜻이지만, 이제는 일과 마음을 정돈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오래된 말이 현대의 삶과 다시 맞물릴 때 언어는 새 생명을 얻는다. '연말 갈무리', '한 해 갈무리 자리'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다.
개인적으로는 '해넘이 자리'라는 말이 마음에 든다. 해가 지는 풍경 속에서 한 해의 그림자를 돌아보고, 다음 해의 빛을 맞이하는 느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고마움 모음 자리', '해 끝 인사마당'처럼 각자의 모임 성격에 맞게 자유롭게 빚어 써도 좋겠다.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보다 사용자의 감각이며, 어울림 속에서 자연스레 다듬어지는 과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 관계가 느슨해질수록 말은 그 틈을 메운다. 다정한 표현 하나가 마음의 피로를 덜어 줄 때, 우리는 언어의 힘을 새삼 실감한다.
올겨울, 달력을 한 장씩 넘기며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올해를 우리는 어떤 말로 불러 마무리할 것인가?"

- 최창일 시인(이미지 문화평론가)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