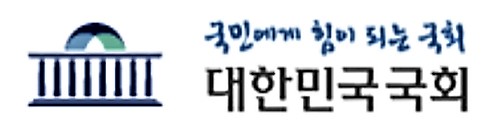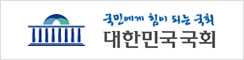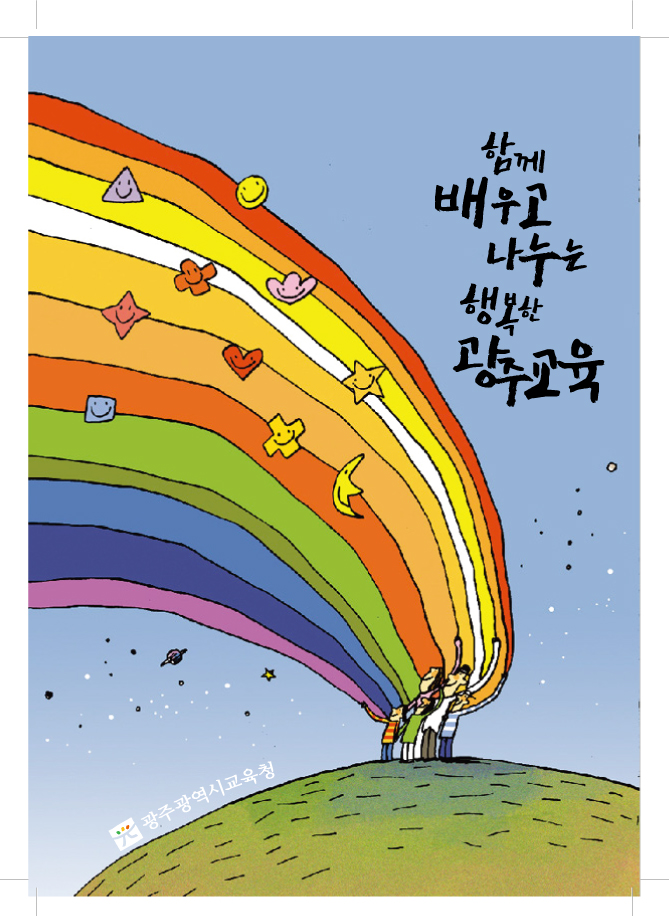(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열수 시인의 첫 시집 <나도 빈집에 남은 낙타였다>가 도서출판 도화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부재 이후 남겨진 삶을 '회상'과 '그리움'이라는 정직한 언어로 기록하며, 상실을 견디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자세를 묻는 작품집이다.
그러나 이 시집에서 시인의 기록은 단순한 애도의 진술에 머물지 않는다. 상실을 견디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자세를 묻는, 깊고도 낮은 목소리의 시학으로 확장된다.
총 3부, 101편의 시로 구성된 이 시집은 개인적 비극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겪는 삶과 죽음의 숙명으로 시선을 확장한다.
제목에 등장하는 '빈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뒤 비어버린 삶의 내부이자 남은 자가 홀로 감당해야 할 시간의 은유다. 시인은 그 빈집에 '남은 낙타'로 자신을 위치시키며, 떠나지 못한 존재의 고독과 끝내 삶을 건너가야 하는 숙명을 형상화한다.
1부에서는 아내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의 일상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회상'과 '첫 휴가' 등에서 두 아들의 성장과 어머니의 부재는 시간의 무심함과 동시에 삶의 지속성을 드러낸다. 특히 뇌사 상태의 어머니에게 "좋은 꿈 꾸면 안 된다"고 말하며 울음을 삼키는 아이의 모습은, 이 시집이 도달한 가장 절절한 슬픔의 장면으로 오래 남는다.
2부로 넘어가면 시인의 시선은 자연과 존재론적 사유로 확장된다. 산과 바람, 나무와 별의 이미지를 통해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을 하나의 질서로 껴안는다. '그 산에는', '매미울음' 등에서는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죽음의 순간마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음을 묵묵히 증언한다.
3부에서는 시 쓰기 자체에 대한 성찰이 두드러진다. '너와 나의 시'에서 시인은 시를 '혼자 쓰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가는 또 다른 생의 고백"으로 정의한다. 이는 이 시집 전반을 관통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의 시는 언제나 '나'에 머물지 않고, 타인의 고통과 기억, 공동의 상실로 나아간다.
문단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안상학 시인은 "김열수 시인의 시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을 잃고 시를 얻었다"며 "그의 시는 환생한 사람이며, 슬픔을 통해 복원된 사랑"이라고 평했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회상과 그리움으로 걸어가는 서정의 오솔길에서 발견된 보석 같은 시"라고 평가했으며, 황현대 시인은 “그의 시를 읽으면 아픔과 슬픔마저 존재의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열수 시인은 “위로하는 마음은 크지만, 위로하는 방식은 서툴다"고 말하며, 이번 시집 출간을 통해 자신과 같은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뜻을 담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에 시집 100권을 기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열수 시인의 언어는 명료하고 간결하다. 그러나 그 간결함은 비워낸 언어가 아니라, 오래 견뎌 얻은 침묵의 밀도에 가깝다. 사물이 숨겨놓은 천진성과 신성성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그는 삶과 죽음의 변증법을 소란 없이 형상화한다. 그 결과 이 시집은 슬픔을 말하면서도 절망에 머물지 않고, 상실을 기록하면서도 삶의 윤리를 회복한다.
<나도 빈집에 남은 낙타였다>는 한 개인의 비극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귀결된다. 사랑을 잃고도 살아가야 하는 존재, 떠난 이를 가슴에 품은 채 오늘을 건너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정직하게 끌어안은 시집이다. 이 시집을 덮고 나면 독자는 알게 된다. 슬픔은 끝내 삶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우리를 다시 세상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따라서 <나도 빈집에 남은 낙타였다>는 상실 이후에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정직하게 끌어안은 시집으로, 깊은 예술적 실감을 남긴다.
한편 김열수 시인은 계간 <문학저널>을 통해 2024년 등단했으며, 윤동주·이생진·이기철 시인의 시 세계를 애호한다. 나무와 꽃을 가꾸고 유화를 그리는 등 일상의 감각을 시로 확장해오고 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