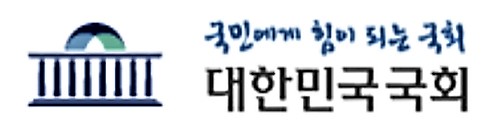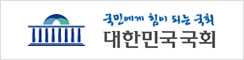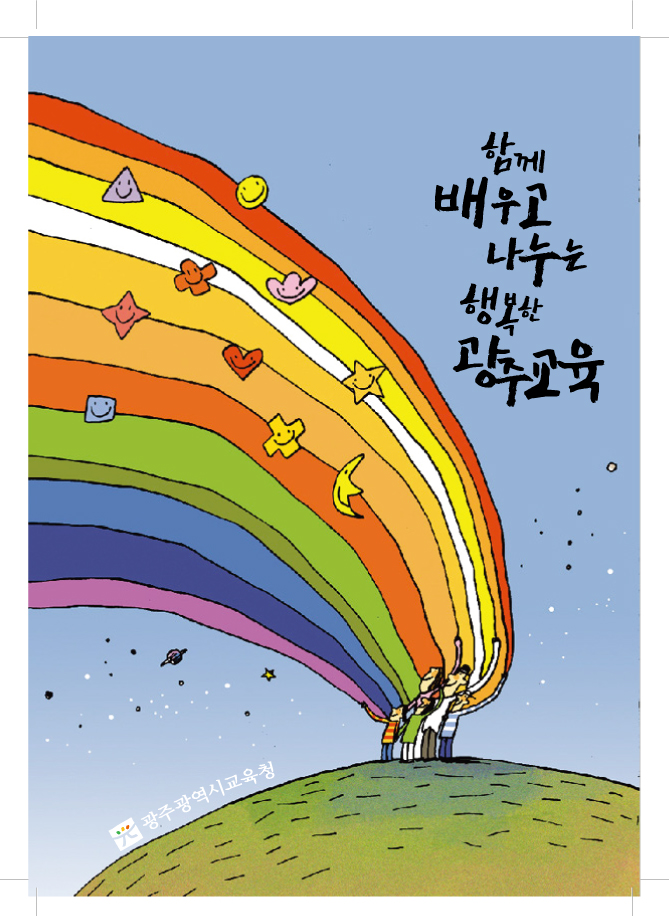(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키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도 내가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다. 설레거나, 벅찬 감정의 순간을 심장(心臟)이 시키는 것. 한시도 멈춤 없는 심장은 키스나 여행에 대하여 관심이 크다. 그것은 설렘이 부딪히는 결정체다. 결국 부딪치지 않는 것은 불륜일까?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키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도 내가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다. 설레거나, 벅찬 감정의 순간을 심장(心臟)이 시키는 것. 한시도 멈춤 없는 심장은 키스나 여행에 대하여 관심이 크다. 그것은 설렘이 부딪히는 결정체다. 결국 부딪치지 않는 것은 불륜일까?코로나19로 해외여행의 문이 닫혔다. 여행을 못한 사람들의 우울게이지가 100이다. 새해, 비행기와 배를 타지 않고 국내여행의 '걷기 코스'를 잡는 것은 어떨까.
서울의 걷고 싶은 길, 1위는 덕수궁길이다. 남대문을 오른편에 두고 덕수궁 길을 돌아 정동으로 이어진다. 작은 언덕을 오르면 서울시립미술관이 된 옛 대법원이 있다. 정동교회(1882년)는 붉은 벽돌 교회로는 나지막한 것이 오히려 높은 천국이 가깝다.
교회는 한국 최초로 지어졌으며 민주화의 성지 역할을 했다. 조금 지나면 러시아공사관이 나타난다. 구한말에 지어졌으나 가슴 저린 사연을 담고 있다. 순종이 커피를 처음 맛본 장소다. 장인의 손길이 만든 돌담길은 태평로의 번잡함을 잠재우고 정동으로 이어진다.
이 고즈넉 분위기가 팡세가 말한 '군중속의 고독'일 것이다. 그곳은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이국적인 분위기, 심장이 뛰면서 안내 한다.
어느 해 정초였다. 이 길을 걷는데 함박눈이 눈앞을 가렸다. 선(線)으로 지어진 덕수궁 기와지붕위에 함박눈이 겨울그림을 그렸다. 궁궐에 내리는 눈은 왕들의 눈이다. 그것은 '겨울연가'와 '러브스토리'의 영상처럼 기억의 시간을 만든다.
함박눈은 덕수궁을 걷는 이들의 이마에 부딪치며 무슨 말인가 하고 싶다. 시인은 말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천국의 편지다. 편지를 받아 읽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한복차림의 젊은 연인들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눈의 결정체포착에 여념이 없다. 외국인들은 하늘을 향하여 그만 넋을 놓는다.
함박눈과 조우(朝雨)는 예고된 일도 아니다. 뜻하지 않는 우연이다. 여행은 늘 이렇게 자연과 부딪치는 키스다. 그칠 줄 모르는 함박눈을 맞으며 돌담길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걷는다. 이곳에서 한발 한발 내 딛는 것은 역사의 시간이다.
시청별관 스카이라운지에서 덕수궁을 바라보는 것은 조선 왕조 600년 위엄이 들린다. 얼굴이 들여다보이는 아메리카노가를 들고 창가에 앉아 덕수궁정경을 담는다. 비행 중 구름을 내려 보는 그것이다. 덕수궁 길은 언제나 평온하다. 가끔씩 차들이 일방통행으로 지나갈 뿐, 걷는 사람은 추억의 시간을 주머니에 넣는다.
'걷고 싶은' 거리 2위는 성북구의 성곽길이다. 구 시장관사는 성곽위에 지어진 건물이다. 한양이었던 그 시절을 잠시 여행하도록 자료들이 정돈되어 있다. 성곽을 따라 따라가면 플로리스트 박물관이 보인다.
플로리스트 박물관은 세계최초로 꽃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다. 박물관 설립자는 방식(독일 상공부가 수여한 독일명장)회장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드라이플라워를 도입한 꽃장식가다. 300여 평이 되는 정원에는 천여 종의 식물이 있다. 설립자가 세계 여러 나라 여행 중,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들을 하나씩 들여온 종들로 채워졌다.
1, 2층에는 방식명장이 손수 만든 작품들이 있다. 콩 중에서 제일 크다는 콩도 있다. 어린아이의 주먹 정도다. 물속에서 3년을 떠다니면서 싹이 튼다. 꽃장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다.
어머니를 주제로 한 골무의 벽면 장식은 장관이다. 무려 1만개의 골무를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만든 작품이다. 방식 명장이 새벽이면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한 시간여씩 공들인 작업의 결과다.
백남준(1932~2006) 아티스트는 비디오를 통하여 20세기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의 심장에 충격을 주었다. 예술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굿모닝 미스트 오웰'의 작품에 감동을 받았다. 우스개로 백남준 작가는 예술가들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예술가들에게 예술로 충격을 먹이면 심장이 강해진다는 속설이다. 방식 명장도 백남준 작가와 더불어 비범(非凡)의 작품을 보여준다. 박물관 1층 공간의 천정은 식물들이 자라며 꽃을 피우고 있다. 유리천정은 구름이 흐르는 모습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곳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더 고즈넉하다. 우리, 새해는 심장이 키스 하게 하자. 걷고 싶은 거리를 심장이 시키는 대로 걷자. 키스는 여행이다.
 - 최창일 시인(이미지문화학자, '시화무' 저자).
- 최창일 시인(이미지문화학자, '시화무' 저자).i24@daum.net